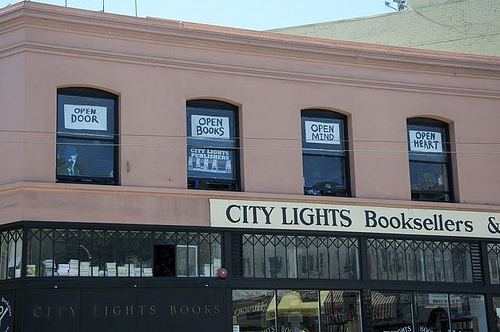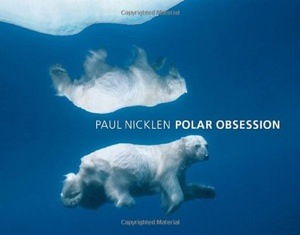개중 선전하는 일본의 출판업계도 울상이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치있는 온라인 활동을 보여온 뉴욕타임즈 역시 2010년 다시금 유료서비스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아마존의 킨들이 불을 지피고:p 구글의 책 스캔 프로젝트가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으나(예상 밖으로 조용하다) 이거 작지 않은 문제다. 먹고 살자는 문제, 그 수익구조 문제, 돈 문제 아닌가.
스트로스의 블로그도 의견을 구하고 있다. 곱씹어 생각할 거리를 주는 “돈 문제 (왜 구글은 내 친구가 아닌가)“를 사정없이 대충 옮겨본다.
The monetization paradox (or why Google is not my friend) – Charlie’s Diary
신문은 독자의 구독료로 돈을 벌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광고로 수익을 낸다. 어쩌면 독자 개인은 발행비용의 10%도 부담하지 않을지도. (영국 기준이겠지만) 64페이지 신문에는 6만 단어 이상이 든다. 글쓰는데는 돈이 든다. 재촉을 하고 현장취재 대신 재활용을 시키더라도 하루에 다섯 꼭지 이상 쓰기는 어렵다. 그러면 글쓰는 사람 스무 명에 오탈자에 문법을 교정하고 확인하고 이래저래 편집자 열 명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조판, 인쇄 등등. 삼사십에 경영진이 최소, 현실적으로는 200 명 정도 들게다. 부당 반 파운드씩 연 330일을 백만부씩 낸다면 연 1억 8천만 파운드 쯤. 종이, 인쇄, 배포 비용은 계산에 넣기도 전이다.
상당수의 신문은 실제 기자와 편집자 수를 줄여 비용을 깎는다. 연합뉴스, AP, 로이터 등등 덕이다.
장부 상으로는 말이 된다. 기자 80%, 편집자 50% 줄이면 이 가상의 40인 신문사는 30명 줄여 연 90만 파운드를 절약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신나간 짓이다. 결산에서 1,2% 아끼느라 독자를 엿먹이는 짓이다. 정기물을 살리는 것이 구독자요 그 숫자가 광고단가를 결정한다. 독자를 줄이는 수는 광고수익을 줄이고 인터넷 광고와 경쟁한다는 것은 재앙이 되기 쉽다.
Continue re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