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가 조금 오랜만에 글을 올렸다.
존재론적 호러로 시작하는 글을 대충대충 옮겨보자.
H.P.러브크래프트가 호러를 창시한 것은 아니지만 오픈소스 호러 신화의 시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리에 쥐가 날 만큼 고대의 방대한 우주(비샵 어셔가 아니라 에드윈 허블의 천체학 덕에)에 정신없을 지성체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그들 발치의 먼지에 불과하다. 이 종말론 속에서 러브크래프트는 서늘한 묵시록의 결말을 만들었다. 어느날 별들이 늘어서고 죽지 않고 잠들었던 존재가 깨어나 지상으로 돌아오리가, 형용할 수 없는 악몽이 산 자들에게 닥치리라. 뭐 그런거다.
생각하면 러브크래프트식 신화 속 고대의 귀환은 서구 신화의 진부한 예와 공통된 점이 있다. 내 세대의 성장에 그림자를 드리웠던 핵전쟁의 공포와 아마게돈, 묵시록, 과학소설로 비틀면 유일점. (까닭없이 똘똘이들의 휴거일까)
물론 차이점이 있다. 유일점에 관한 한, 별들이 온 다음은 생각할 수 없다. 인류는 주위의 우주를 체록할 지성계 먹이사슬의 우생종이 아니다. 사실은 그들 발 밑의 먼지니까. 기독교 종말론은 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들의 천국, 나머지는 불신지옥) 열핵 아마게돈은 소설에서 정당한 징벌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는 무시무시하게 묘사된다. (영화 스레드나 소설 리보위츠를 위한 찬송)
그러나 좋은 농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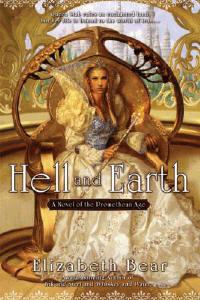 엘리자베스 베어의 프로메테우스 시대 연작. 스트랫포드 맨 하권.
엘리자베스 베어의 프로메테우스 시대 연작. 스트랫포드 맨 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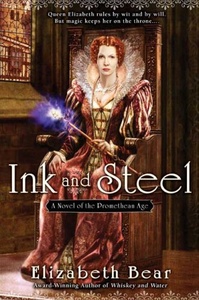 프로도, 빌보 배긴스와 같은 생일을 가진
프로도, 빌보 배긴스와 같은 생일을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