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는 흥미롭다.
수요와 공급, 가격과 매출 때문이 아니다. 사회와 심리와 주고받는 영향이 흥미롭다. 최근 몇 주 간 전세계가 요동친 경제 위기를 신문의 온라인 광고 수익과 연관지은 기사를 옮겨본다. 스테파니 클리포드의 글. 포탈에 도매로 뉴스를 팔다 어렵게, 뉴스 납품업체가 된 경우와는 꽤 다르다.
Advertising – Newspapers’ Web Revenue Is Stalling – NYTimes.com
미국 신문협회가 2003년 온라인 수익을 측정한 이래 확장만 하던 광고시장이 올 2분기 처음으로 줄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4% 떨어진 $777,000,000.
전반적인 온라인 광고는 여전히 건재하다. 경영진들의 의견에 따르면 새로운 기능은 더 많은 독자를 끌어들인다. 개별 독자 수는 올 8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간에 비해 17% 증가한 6930만. 경기침체와 소액광고의 감소가 원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화면는 줄었고 광고단가를 낮추어야 만 했다.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은 홈페이지의 광고공간에 더 비싼 요금을 받는다. 조회수 1000 당 $15에서 $50. 신문들은 광고망이라는 중간단계를 통해 그 아래의 공간을 채운다. 1000 당 $1 정도의 가격이 일반적인데 광고망 업체는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다. 광고망 의존도는 꼭 좋은 일 만은 아니다. 다 같은 물건으로 만드는 셈이다. 광고망을 피하는 전략을 펴는 곳도 있으나, 7개 매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독자적인 광고로 메꾸지 못한 공간이 2006년에 비해 작년 늘었다.
USA투데이를 소유한 가네트의 미국 온라인 매출은 2분기에 3% 늘었다. “광고가 매진이라면 광고망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현실에서 광고망을 쓸 만 합니다.” 제프 웨버의 말이다. 다른 업체들의 결과는 좋지 않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분기에 A.H.벨로는 12%, E.W.스크립스는 8%, 트리뷴社는 9% 줄었다.
뉴욕타임즈 미디어 그룹의 광고책임자 드니즈 워렌은 우려가 있지만 광고망을 쓰는 이유를 설명한다. 금융위기로 조회수가 껑충 뛰었던 지난 9월처럼 조회수가 치솟을 경우 효과적이다. Continue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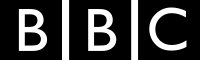

 BBC와 달리 PBS는 TV만 하고, 라디오에는
BBC와 달리 PBS는 TV만 하고, 라디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