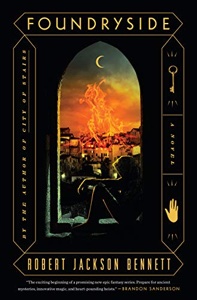 로버트 잭슨 베넷의 새 소설 파운드리사이드 Foundryside. 마법이 산업화된 도시 테반느 Tevanne에서 펼쳐지는 새 이야기의 첫번째다.
로버트 잭슨 베넷의 새 소설 파운드리사이드 Foundryside. 마법이 산업화된 도시 테반느 Tevanne에서 펼쳐지는 새 이야기의 첫번째다.
산치아는 자신의 능력을 정말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계가 뭔지, 믿을만한지 조차도. 그저 그렇게 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 뿐이었다.
맨살에 물건이 닿으면, 이해했다. 본질, 구조, 모양을 이해했다. 최근에 어딘가 갔거나 뭔가와 닿았다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양 그 감각을 기억할 수 있었다. 마법을 건 물건에 닿거나 가까이 간다면 머리속에서 명령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산치아 그라도 Sancia Grado는 솜씨좋은 도둑. 작지만 날래고 강단이 있다. 그리고 맨손바닥을 대는 것으로 물건이나 장소를 읽는 능력이 있다. 경계가 삼엄한 부두창고에서 물건 하나를 빼내는 의뢰를 받을때까지는 어려운 일도 헤쳐나왔는데. 훔쳐낸 물건이 뭐길래 산치아를 쫓는 이가 끊이지 않고 위험이 말이 아니다. 물건에 신기한 힘과 감각을 불어넣는 마법 scrive을 독점하는 4대 가문의 누군가가 그 물건을 위해 산치아를 죽이려는데..
그레고는 마법을 건 무기를 잘 알았다. 마법을 건 무기는 끔찍하게 비싸지만 테반느가 전쟁에서 이겨왔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힐끗 보고 무기의 마법을 알수는 없었다. 뭐든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계몽전쟁에서 쓰인 일반적인 칼은 휘두르는 대상의 약점을 자동적으로 겨누도록 마법을 걸었다. 그리고 그 약점에서 더 약한곳, 더 약한곳 중 가장 약한곳, 정확하게. 이 명령대로 휘두르면, 튼튼한 참나무도 힘들이지 않고 자를수 있을 것이다.
그건 단지 한가지 가능성. 다른 마법은 칼날이 강화된 중력으로 허공을 가른다고 믿게 만들었다. 예를 들자면 채찍의 머리에 건 마법처럼. 갑옷이나 무기처럼 다른 금속을 파괴하도록 특정한 마법을 걸수도 있었다. 어쩌면 휘두를때 무척 뜨겁게 불타 상대를 불붙일 가능성도 있다.
두 악한이 사크의 방을 활보할때 그레고의 머리 속에 이 모든 가능성들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그들이 무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했다.
정의를 써넣어 특성을 바꾸는 마법과 그 마법의 역사, 그에 따라 발전한 사회구조가 인물의 사연과 잘 짜여져 있다. 베넷의 소설답게 책 속 세계가 흥미롭고 묘사가 사실적인데, 상처가 있지만 밝은 주인공이 좋다. 전작보다 더 열려있다는 느낌. 미친과학자 타입의 스크라이버 오르소 Orso, 마법을 새겨넣는 패브리케이터 베레니스 Berenice, 귀족의 특권보다 정의를 찾는 그레고 Gregor 등 주변인물들이 인상적이고 매력적인데, 소개와 전개가 아주 매끄럽다. 내가 읽었던 작가의 소설과 비교해도 그렇고, 올해 읽은 몇권 되지 않는 중 가장 재미있는 소설.
